home  문화사료관
문화사료관  사료로 본 제천
사료로 본 제천
사료로 본 제천
제천문화원 사료로본 제천 입니다.
제천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 볼 수 있는 게시판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제천의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화 지역적 특성과 산물 등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왕조실록] 사회적 상황과 인물
|
1. 재해와 구휼 더구나 재해에 대한 구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령의 능력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인사(人事)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자연재해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
||||||||||||||||||||||||||||||||||||||||||||||||||
|
제천과 청풍 일대의 기사 가운데서 특히 자연재해에 관한 것은 그 빈도가 상당히 많다. 이것은 당시에 이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 관한 기사들 통해서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에 관한 기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조선이 기본적으로 농업에 의존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농업은 전적으로 자연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피해 사례는 다양하여 우박이 내리거나 천둥 번개가 치고 큰비가 내려 수해를 입는 경우,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단종 1년 6월 2일에는 지진이 일어난 충청도 지방에서 해괴제(駭怪祭)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괴제는 조선시대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중심이 되는 고을에서 지내던 국가 단위의 제사를 말한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 국가단위의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재해가 당시의 사회에서 그만큼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이때의 기록에는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을 비롯하여 특이한 자연현상에 관한 기록도 있다. 제철이 아닌 때에 꽃이 피거나 흙비가 내리는 등의 현상은 농업과 상관없이 그 시점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하여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구휼관련
기사
|
||||||||||||||||||||||||||||||||||||||||||||||||||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재해 관련 기사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진 재해 가운데서도 사실상 가장 대표적이며 규모와 피해가 큰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재해관련 기사와 구휼 관련 기사의 발생빈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선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재해 관련 기사들이 폭우나 번개, 우박 등의 일시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것이라면 구휼과 관련된 기사는 장기적인 가뭄과 재황을 구제하는 방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쪽에 치중하여 나타난다. 부역을 견감하고 기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용 곡식을 충당하는 등의 조치가 관찰사나 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흉년으로 타격을 입을
경우 제천창(堤川倉)에 보관되었던 곡식을 내어 기민을 구제하는 데에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세종 5년 3월과 9월에 각각
나타난다. 제천창의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크고 저장된 곡식의
양도 많았기 때문에 충청도 일원이나 강원도 등지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메우는 데에 제천창의 곡식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가뭄이나
수재(水災) 외에도 여역( 疫), 즉 돌림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경우의 구제방안도 등장한다. 실제로 명종 17년 4월 19일에는
진천현과 제천현에 여역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자 의관(醫官)을
파견하여 구휼(救恤)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효행을 한 인물에 대한 것으로 효행 자체가 부각될 뿐 인물에 대한 설명은 거의 배제되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로 여겨지는 인물들은 제천과 인근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본관이 청풍이거나 이 근방에서 치적을 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이 지역 출신 인사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사(人事)와 인물(人物)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구별해보면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대부분 인사에 관련하여 인물의 자질을 논하는 쪽에 치중되어 나타난다. 효행에 대한 포상과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연산군 6년 2월 17일과 중종 28년 4월 5일의 기사에서는 효행에 대한 포상의 조치가 나타난다.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아 가며 병구완을 했던 청풍(淸風) 사람 충찬위(忠贊衛) 유자하(柳自河)의 경우 절의(節義)와 효행(孝行)을 인정받아 정문(旌門)을 하사 받았다. 더불어 복호(復戶)를 받는 특혜를 누리기도 한다. 중종 28년 4월 5일에는 청풍군 중의위 윤임의 처 안씨가 화재 때 시어머니를 구하다 목숨을 잃자 그것을 기려 포장(褒奬)하였다. 중종 29년에는 윤계손(尹季孫)이 제천현감으로 있다가 병을 얻자 그 아들 윤개(尹漑)가 아비의 병세를 돌볼 수 있도록 사은사로 선발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차출하여 대신 보내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행을 장려하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효와 충은 유학을 근본으로 하는 조선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구체화된 사회적 덕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배려하는 움직임은 곧 국가적 이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을 것이며 아울러 백성들이 그것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동기 부여책으로 작용하기도 했을 것이다. |
||||||||||||||||||||||||||||||||||||||||||||||||||
|
제천의 인물 관련 기사
|
||||||||||||||||||||||||||||||||||||||||||||||||||
|
<조선왕조실록>상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청풍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바로 청풍부원군
김우명(金佑明/1619∼1675)이다. 김우명은 현종의 장인으로 본관이 청풍이다.
김재로(金在魯/1682∼1759) 역시 본관이 청풍으로 1702년(숙종 28) 진사가
되었고, 이후 많은 벼슬을 거쳐 봉조하에 이르렀다. 왕조실록에는 권상하(權尙夏/1641∼1721)도
역시 청풍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암 송시열과의 사제관계
때문이다. 실제로 왕조실록에는 청풍이나 제천 등지의 인물에 관련된
내용이 드문 편이다. 대체로 본관이 청풍인 인물이나 청풍과 제천 등지에서
수령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제천의 인물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천의 인물지나 『환여승람』 등의 부수적인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고을 수령의 자질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윤택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기 때문에 성품이 탐욕스럽거나 일을 능수 능란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 백성을 재난에서 구휼하지 못한 것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수령에 대한 탄핵은 주로 어사에 의한 감찰에서 드러나는 죄상이나 소홀함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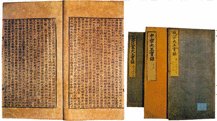 왕조실록의
기사 가운데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상이변이나 재해에
관한 내용이다. 기상이변은 전형적인 농업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계는 물론 심한 경우 국가의 재정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제천과 청풍 일대에서도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재해에 대한 대비와 구휼의 움직임이 동반되어
나타난다.
왕조실록의
기사 가운데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상이변이나 재해에
관한 내용이다. 기상이변은 전형적인 농업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계는 물론 심한 경우 국가의 재정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제천과 청풍 일대에서도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재해에 대한 대비와 구휼의 움직임이 동반되어
나타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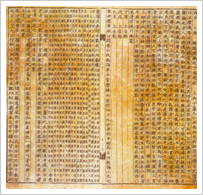 첫째는 그 지방 출신의 유능하고 청렴한 인물의 졸기나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관료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것으로, 한 인물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다.
첫째는 그 지방 출신의 유능하고 청렴한 인물의 졸기나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관료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것으로, 한 인물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다.

